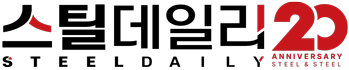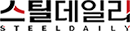다양한 개념으로 언급되는 회복탄력성은 원래 자리로 되돌아오는 힘, 회복력이나 복원력 정도로 의미를 이해할 수 있겠다. 심리학적 관점에서는 역경과 시련, 실패 등 바닥을 치고 올라올 수 있는 ‘마음의 근력’으로 설명되기도 한다.
연초 철근 시장에서 회복탄력성은 아직 희망에 가깝다. 현실은 강한 취약성을 드러낸 부정적인 관성의 연장선에 놓여있다. “우리 스스로는 못 멈출 것 같아…”라던 누군가의 고백이 말하듯, 철근 시장은 자기 통제력을 잃은 듯한 모습이다. ‘바닥’에 대한 논쟁이 무색하게 더 떨어진 가격. “거래가 아예 없다 보니, 이제는 얼마에 팔아야 할지 모르겠어…”라는 또 다른 고백이 솔직한 심경을 드러낸다.
불과 얼마 전까지, 부족한 재고를 찾아 동분서주하던 시장이었다. 기대감으로 충만했던 철근 시장이 뒤집힌 것은 하루 이틀 사이였다. 그 짧은 시간 동안 철근 시장의 균형이 크게 바뀐 것은 아니었으나, ‘기대’라는 마음만 바뀐 것 뿐.
기대심리가 사라지면서 거래가 멈췄다. 거래가 멈추다 보니, 가격이 떨어졌고. 가격이 떨어지니 시장엔 더욱 단단한 빗장이 걸렸다. 악순환의 신뢰가 굳어지면서 웬만해선 녹지 않는 냉각상태가 됐다. 이번 시세급락 역시 원망스러운 심리 탓이 컸다.
지난 연말의 거래열기가 거품이었을까. 연초 철근 시장은 거품을 걷어내고도 한참을 내려섰다. 이제는 매출이 아닌 적자판매를 걱정해야 하는 지경이다. 그럼에도, 철근 가격은 야속한 내리막을 걷고 있다.
한 유통업체 사장이 화들짝 놀라 전화가 왔다. ‘큰 맘 먹고 시중가격보다 2만원이나 낮은 가격을 던져봤는데, 시장은 관심도 보이질 않더라’는 것. ‘가격이 더 떨어질 것을 감안해도, 2만원이나 낮은 가격은 무조건 잡을 것으로 믿었는데 큰 충격을 받았다’는 요지였다.
통화내용 대로라면, 철근 유통시장은 적어도 2만원은 무의미한 인하폭이다. 가격을 내려도 어차피 안 팔리기 때문이다. 그렇게 따지면, 연초 들어 거래 없이 떨어진 톤당 4만원~5만원의 낙폭 역시 무의미한 것이었다. 얼어붙은 수요를 저가판매로 녹일 수 없다는 것은 시장의 진리다.
지난해부터 철근 시장은 기준가격이 오르는 시점에 시중가격이 떨어지는 패턴을 반복하고 있다. 상식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단어가 ‘심리’다. 심리를 쫒는 가격흐름이 강하게 연출되는 셈이다. 결국,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의 마음을 다스리는 일이 중요하다.
역설적이지만, 팔기 위해서는 저가판매를 멈춰야 한다. 떨어지던 가격이 멈춰야 거래가 살아나고, 가격 또한 회복될 수 있다는 또 다른 진리다. 아이러니하게도 시장에서의 회복탄력은 그렇게 출발한다.
자유경쟁과 자연스러운 가격형성을 막고자 하는 바람은 없다. 다만, 하루하루 커가는 적자폭을 걱정하면서도 저가경쟁을 멈추지 못하는 시장의 잘못된 답을 지적하고 싶을 뿐이다.
정호근 기자
webmaster@steelnstee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