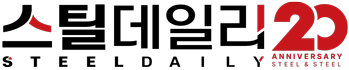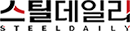구조조정 및 인력 조정을 시행한 업체들에게는 아픔이지만 남아 있는 업체들에게는 필요한 인력을 구할 수 있는 인재 시장이 열린 셈이다. 하지만 기업들은 근로 계약 당시 ‘경업 및 전직금지 서약서‘를 작성하게 하여, 퇴사 인력에 대해 약정한 기간 동안 경쟁업체로 이직하거나 경쟁회사를 창업하지 못하게 하는 족쇄를 채우고 있다.
이러한 족쇄는 노조에 가입되어 있는 생산 전문 인력보다는 사무∙기술직, 특히 연구개발(R&D)직 관련 인력들에게 더욱 강력하게 적용되고 있는 듯한 모습이다. 생산 전문 인력은 생산 노하우를 가지고 당장 설비를 가동할 수 있는 수준이며, 영업사원들은 영업 인맥을 활용하여 독립 유통업체를 꾸려 나갈 수 있으나 이에 대해서는 대부분 문제를 제기치 않고 있다. 유독 사무∙기술직, 특히 연구개발직에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연구개발부서에서 근무하다 동종업계로 이직하는 경우, 이전 직장의 기술이나 영업비밀을 이직한 회사에서 사용하게 되면 공정거래법 상 문제가 된다. 하지만 모든 동종업계 취업의 경우가 경업금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직원에게는 헌법상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 헌법상의 기본권 또한 보장되어야 한다. 입사 시 ‘일정기간 경쟁업체 이직 금지’의 서약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경쟁업체로의 이직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근로자 개개인은 기업에서 제기한 민사소송에 대응하기에는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변호 비용과 생업에 지장을 초래하기에 결국에는 손을 들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철강업계가 불황 속에 머물러 있는 상황에서 ‘저 갖기는 싫고, 남 주기는 아깝고’ 식의 반응은 업계의 폐쇄성만을 부추길 뿐이다.
짧게는 수년에서 길게는 수십 년을 종사한 근로자에게 동종업계 이직금지란 굴레를 씌운다면, 철강업계는 점점 우물 안 개구리가 되어갈 것이다. 기업간 상생만이 전부가 아니다. 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상생해야 진정한 상생의 사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정예찬 기자
webmaster@steelnsteel.co.kr